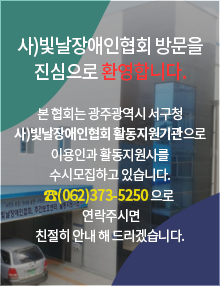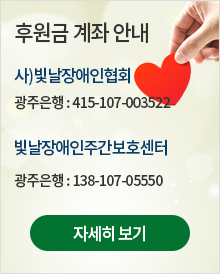열린게시판
발달장애인의 주도권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70회 작성일 22-08-04 09:28본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8-02 13:40:20
나는 투잡러이다. 평일에는 직장인으로 맡은 바 임무를 다한다.
회사를 쉬는 주말에는 한 사회복지기관에서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지원 사업 홍보 일을 맡고 있다.
하루는 기관이 지원하는 자조모임 현장 취재를 다녀왔다.
사전에 사진 촬영 동의를 얻고 모임 활동을 지켜보며 촬영을 진행했다.
모임에는 장애정도가 중증이신 분들이 많아 보였다. 부모 혹은 활동지원사로 보이는 분들이 옆에서 활동을 지원해 주셨다.
이날은 가위로 오리고 붙이는 만들기를 하였다. 가위질이 서툴려도 당사자가 하겠거니 생각했다.
활동을 지원해 주시는 비장애인 분들은 옆에서 지켜보거나 거드는 광경이 펼쳐질 거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웬걸 내 생각과는 정 반대의 상황이 연출되었다.
몇몇 비장애인 분들이 가위 주도권을 잡고 있었다. 당사자분들은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기만 했다.
내가 사진을 찍으러 다가오자 서둘려 가위를 당사자에게 쥐어주는 광경은 씁쓸함만 남겼다.
발달장애인의 자기 결정권과 주도권을 중요시 여기는 기관에 이 사실을 어떻게 보고 드리면 좋을지 한참을 고민했다. 내가 잘못 봤기를 바랐다.
내가 그 모임에 참여자로 있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그 상황에선 나도 멀뚱멀뚱거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다.
나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여도 남이 해주겠다고 나서면 무기력하게 주도권을 넘겨주고 마는 사람이니까!
다행히 나는 아직까지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았다. 오히려 주도권을 넘겨받았다.
내가 활동하는 사회복지단체에서 얼마 전 비장애인 조력자와 다른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함께 셋이서 여행을 다녀왔다.
조력자님이 여행 계획을 우리 보고 세워달라고 하셨다. 자신은 운전만 할 거라고 했다.
여행은 기대가 되었지만 여행 계획 세우기 주도권을 나에게 주셔서 당황스러웠다.
다행히 숙소는 정해진 상태였다. 가족여행 갈 때는 졸졸 따라만 다닌 탓에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다.
마음은 '조력자님은 운전만 해 주세요. 저희가 다 할게요.'라고 하고 있었다. 의지가 불타올랐다. 아쉽게도 여행 당일 그런 상황은 연출조차 되지 않았다.
결과는 조력자님이 운전도 하시고 마트에서 길 잡이 역할도 하시고 숯불에 고기도 구우시고 여행함에 있어 가장 큰 일들을 다 하셨다.
우리도 소소하지만 중요한 일들을 했다. 계획도 세우고 마트에서 무얼 살지 메모도 하고 식탁에 수저도 놓고 접시에 반찬도 놓고,
고기를 먹은 후, 후식으로 먹을 라면도 끓이고 설거지까지...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다. 우리의 일도 결코 하찮지 않았다.
만일 조력자님이 내가 계획도 세워주고 여행지에서 밥상도 차려줄 테니 줄 테니 너흰 따라만 와라고 하셨다면 어땠을까?
몸은 편했을지도 모르지만 마음은 불편했을 테다. 조력자님은 혼자서 모든 걸 다 하시느라 여행길이 아니라 고생길이 됐을 테고
우리는 너무 미안해서 어쩌면 다음 여행을 기약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조금 느려도 함께 해야 오래가는 법이다.
가족 여행과는 달리 나름 열심히 움직였다. 가족이 아닌 사람들과 떠난 첫 번째 여행!
일방적인 희생이 없는 동등한 여행을 만들고 싶었다. 과연 나와 한번 더 가고 싶은 여행이 되었을까?
장애를 가졌다고 도움받기만 해선 안된다. 무기력해질 뿐만 아니라 장애, 비장애 통합을 늦추는 길이라 생각된다.
일방적인 희생은 서로를 지치게 만든다. 비장애인 또한 장애인도 어떠한 방식이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인식해야 된다.
내가 사용한 책상 닦는 일 정도는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호칭과 관련해서도 한 편의 분량을 채우고 싶을 만큼 하고 싶은 말이 많다.
발달장애인 당사자끼리는 '님', '씨', 혹은 '언니', '오빠'와 같은 호칭을 쓰게 하면서 비장애인에게는 '선생님'이란 호칭을 쓰도록 유도하는 걸까?
이들이 실제로 사제지간이거나 비장애인도 발달장애인에게 선생님이라고 부른다면 모를까
서로가 서로를 조력하는 동등한 관계가 된다면 70대 발달장애인이 20대 비장애인에게, 혹은 자신과 동갑내기 비장애인에게
'선생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머리를 조아리며 극존대해야만 하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본다.
도움을 주기만 하는, 즉 주도권을 쥔 자가 권력을 잡게 되어있다. 도움을 받기만 하는,
즉 권력이 없는 자는 죽을죄를 짓지 않았어도 수그릴 수밖에 없다. 수그릴 자격은 발달장애인에게도 없다. 장애가 죽을죄는 아니니까!
장애가 심하든 경하든 모든 발달 장애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서만큼은 부디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조력자, 활동지원사, 가족은 아주 간단한 일이라도 좋으니 우리에게 주도권을 쥐어 주었으면 좋겠다.
떠 먹여 주지 말고 떠먹을 수 있도록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더디고 어설퍼 속이 터질 것 같아도 묵묵히 기다려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의 능력을 너무 얕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투잡러이다. 평일에는 직장인으로 맡은 바 임무를 다한다.
회사를 쉬는 주말에는 한 사회복지기관에서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지원 사업 홍보 일을 맡고 있다.
하루는 기관이 지원하는 자조모임 현장 취재를 다녀왔다.
사전에 사진 촬영 동의를 얻고 모임 활동을 지켜보며 촬영을 진행했다.
모임에는 장애정도가 중증이신 분들이 많아 보였다. 부모 혹은 활동지원사로 보이는 분들이 옆에서 활동을 지원해 주셨다.
이날은 가위로 오리고 붙이는 만들기를 하였다. 가위질이 서툴려도 당사자가 하겠거니 생각했다.
활동을 지원해 주시는 비장애인 분들은 옆에서 지켜보거나 거드는 광경이 펼쳐질 거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웬걸 내 생각과는 정 반대의 상황이 연출되었다.
몇몇 비장애인 분들이 가위 주도권을 잡고 있었다. 당사자분들은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기만 했다.
내가 사진을 찍으러 다가오자 서둘려 가위를 당사자에게 쥐어주는 광경은 씁쓸함만 남겼다.
발달장애인의 자기 결정권과 주도권을 중요시 여기는 기관에 이 사실을 어떻게 보고 드리면 좋을지 한참을 고민했다. 내가 잘못 봤기를 바랐다.
내가 그 모임에 참여자로 있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그 상황에선 나도 멀뚱멀뚱거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다.
나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여도 남이 해주겠다고 나서면 무기력하게 주도권을 넘겨주고 마는 사람이니까!
다행히 나는 아직까지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았다. 오히려 주도권을 넘겨받았다.
내가 활동하는 사회복지단체에서 얼마 전 비장애인 조력자와 다른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함께 셋이서 여행을 다녀왔다.
조력자님이 여행 계획을 우리 보고 세워달라고 하셨다. 자신은 운전만 할 거라고 했다.
여행은 기대가 되었지만 여행 계획 세우기 주도권을 나에게 주셔서 당황스러웠다.
다행히 숙소는 정해진 상태였다. 가족여행 갈 때는 졸졸 따라만 다닌 탓에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다.
마음은 '조력자님은 운전만 해 주세요. 저희가 다 할게요.'라고 하고 있었다. 의지가 불타올랐다. 아쉽게도 여행 당일 그런 상황은 연출조차 되지 않았다.
결과는 조력자님이 운전도 하시고 마트에서 길 잡이 역할도 하시고 숯불에 고기도 구우시고 여행함에 있어 가장 큰 일들을 다 하셨다.
우리도 소소하지만 중요한 일들을 했다. 계획도 세우고 마트에서 무얼 살지 메모도 하고 식탁에 수저도 놓고 접시에 반찬도 놓고,
고기를 먹은 후, 후식으로 먹을 라면도 끓이고 설거지까지...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다. 우리의 일도 결코 하찮지 않았다.
만일 조력자님이 내가 계획도 세워주고 여행지에서 밥상도 차려줄 테니 줄 테니 너흰 따라만 와라고 하셨다면 어땠을까?
몸은 편했을지도 모르지만 마음은 불편했을 테다. 조력자님은 혼자서 모든 걸 다 하시느라 여행길이 아니라 고생길이 됐을 테고
우리는 너무 미안해서 어쩌면 다음 여행을 기약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조금 느려도 함께 해야 오래가는 법이다.
가족 여행과는 달리 나름 열심히 움직였다. 가족이 아닌 사람들과 떠난 첫 번째 여행!
일방적인 희생이 없는 동등한 여행을 만들고 싶었다. 과연 나와 한번 더 가고 싶은 여행이 되었을까?
장애를 가졌다고 도움받기만 해선 안된다. 무기력해질 뿐만 아니라 장애, 비장애 통합을 늦추는 길이라 생각된다.
일방적인 희생은 서로를 지치게 만든다. 비장애인 또한 장애인도 어떠한 방식이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인식해야 된다.
내가 사용한 책상 닦는 일 정도는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호칭과 관련해서도 한 편의 분량을 채우고 싶을 만큼 하고 싶은 말이 많다.
발달장애인 당사자끼리는 '님', '씨', 혹은 '언니', '오빠'와 같은 호칭을 쓰게 하면서 비장애인에게는 '선생님'이란 호칭을 쓰도록 유도하는 걸까?
이들이 실제로 사제지간이거나 비장애인도 발달장애인에게 선생님이라고 부른다면 모를까
서로가 서로를 조력하는 동등한 관계가 된다면 70대 발달장애인이 20대 비장애인에게, 혹은 자신과 동갑내기 비장애인에게
'선생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머리를 조아리며 극존대해야만 하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본다.
도움을 주기만 하는, 즉 주도권을 쥔 자가 권력을 잡게 되어있다. 도움을 받기만 하는,
즉 권력이 없는 자는 죽을죄를 짓지 않았어도 수그릴 수밖에 없다. 수그릴 자격은 발달장애인에게도 없다. 장애가 죽을죄는 아니니까!
장애가 심하든 경하든 모든 발달 장애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서만큼은 부디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조력자, 활동지원사, 가족은 아주 간단한 일이라도 좋으니 우리에게 주도권을 쥐어 주었으면 좋겠다.
떠 먹여 주지 말고 떠먹을 수 있도록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더디고 어설퍼 속이 터질 것 같아도 묵묵히 기다려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의 능력을 너무 얕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